-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사람의 나이를 물어보는 방법이 세대에 따라서 독특하게 변화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이를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년생이나 띠를 통해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는 방식이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어릴 때는 학년과 학번이 그 자체로 나이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3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빠른 년생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지 년생을 통해 나이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50대 이후에는 외모를 보고 대략적으로 나이 파악이 쉬워지며 사람들이 비슷한 나이대에 속하게 되므로 띠만으로도 나이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띠는 바로 십이간지 동물 순서에 기반한 것입니다. 십이간지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에서 사용되던 시간의 표현 방식으로, 각각의 동물은 한 해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 동물들의 순서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 구성되며 각각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십이간지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사람들의 나이를 표현하는 데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방식이 변화하는 이유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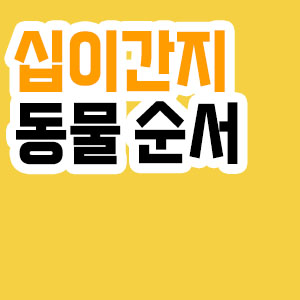
십이간지 동물 순서
십이간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 한자는 각각 동물의 이름으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꾸러기수비대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를 통해 어린 세대들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십이간지를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각 한자가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이런 한자들은 점차 살아가면서 외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쥐는 첫 번째 동물로 알려져 있고, 묘나 사같은 한자는 흔히 쓰이는 한자입니다. 그 외에도 축이나 미 같은 한자들은 느낌으로 대략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추론하여 외울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지에서 십이간지와 관련된 상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십이간지 특성과 총 12가지 동물이 있기 때문에, 행운을 빌어주는 상품이나 기념품 등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각 동물 한자는 특정한 시간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자시에 보자라고 붙일 때, 이것이 정확히 12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11시를 의미하는지는 종종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댓글